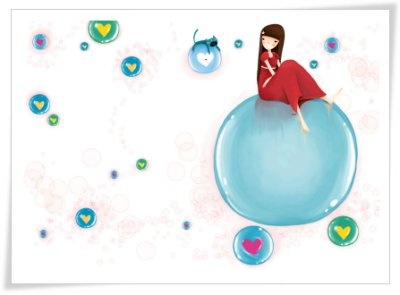87년 03월 15일. 일. 맑고 바람..
온 몸을 감고 스며오는 봄날의 기운이 산뜻한 날이다.
어제가 보름..달이 높다랗게 이 밤의 고독을 밝혀
외롭지 말라는 듯이 누리가 화안하다.
그래..나는 이제 환히 웃을 수 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지..
괜히 눈물이 글썽여진다.
외로와서도 고달파서도 아닌..
무언가 가슴을 후련히 적셔오는 이 느낌..
촉촉히.. 수분을 머금은 풀잎이 된 듯한 느낌이다.
어떠한 시련이 내게로 무자비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겐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목놓아 실컷 울어버릴 가슴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 하랴..
삶안에 허덕이지 않고 삶위에 당당히 군림한다.
환경에 지배 당하지 말고 환경을 굴복시키자.
사람들의 찌들린 듯한 고달픈 모습을 보면서 설움을 한 울 헤어본다.
무엇이 저토록 가련한 사람들의 표정을 만들어 놓았는가..?
왜..저들은 표정 없는 얼굴로 ..
슬픔도 기쁨도 잊어버린듯이 서성이고 있는 것인가..?
주름이 가득 늘어선 어떤 아주머니의 모습..
객지에 나가 공부하는 자식 걱정에 잔뜩이나 찡그리고 계신가..?
우리 엄마..불쌍하신 나의 엄마..아빠..내 동생들..
아~내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고..
그로인해 내 많은 소망이 무참히 부서지더라도
차라리 그것이 슬픈 행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겐 있다.
아~그래서 난 결국 행복한 아이다.
내 삶..그 안에 머물고 있는 내 사랑의 전부인 사람들을 위해..
내일도 열심히 걸어야지..
결코 순탄하지 못할 길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땀흘리며 살아가야지..
그것이..내가 가야할 길인게야..
- 스무살의 벗님 -